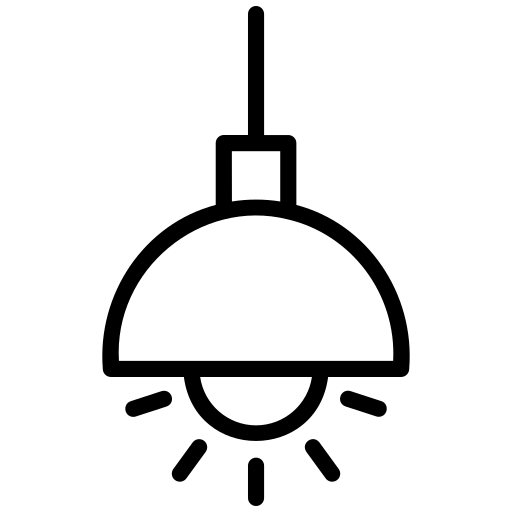도시의 영혼을 깨우다 부산 문화의 창조자들

도시의 영혼을 깨우다 부산 문화의 창조자들
도시의 영혼을 깨우다 부산 문화의 창조자들
부산은 떠난 자들과 남은 자들이 공존하며 특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온 도시다.
2025년, 그 이야기의 장은 여전히 이어져간다.
부산에서 태어난 이들, 타지에서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도시로 돌아온 이들은 각자 부산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삶의 궤적을 남기고 있다.
모두가 다른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결국 '부산다움'이었다.
1925년에 지어진 오초량은 일본의 토목건축업자 다나카 후데요시가 만든 집이다.
해방 이후 태창기업의 창업주 손으로 넘어가며 근대 주택과 생활사가 담긴 공간으로 거듭났다.
2007년 등록문화유산 제349호로 지정된 후 2023년에는 복합 교육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간 <오!분더카머>전 등 다양한 전시를 열어왔으며, 정원에서 편지를 읽고 차를 마시는 <레터하우스: 편지감각> 같은 독특한 문화 행사도 진행해왔다.
최근 최성우 이사장이 기획한 <흙의 전시>를 계기로 100년을 품은 오초량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숨겨진 듯한 느낌을 준다.
안내판조차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길을 잃게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한다.
높은 아파트 틈새에 100년 된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시 속 작은 틈을 발견하는 느낌을 선사하고 싶었다는 이사장의 설명은 인상적이다.
최성우 이사장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오초량으로 이사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설렘과 함께 두려움이 공존했던 기억들, 당시 크고 깊었던 계단과 방 13개를 헤매다 길을 잃을까 봐 무서웠던 순간들
부둣가에 가까웠던 옛 풍경 속 뱃고동 소리와 건물 내부에서 느껴지던 진동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오초량은 1925년에 일본식 주택으로 건설됐지만 일본인은 20년만 살았고 이후 한국인이 이 집에서 80년을 이어 살았다.
일본인 손길과 한국 목수의 흔적이 뒤섞여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이 건물은 단순히 식민지의 잔재로 볼 수 없는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어떻게 우리 문화 속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고 이사장은 강조했다.
최근 기획된 <흙의 시간> 공예전은 국가나 민족의 개념 이전에 근원적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물, 불, 흙, 공기와 같은 세계를 이루는 기본 요소 중 흙을 주제로 삼아 열린 전시로, 향후에는 나무나 실과 천 등 다양한 자연 소재를 주제로 삼은 시리즈도 계획되고 있다.
오초량은 개인 주택에서 모두가 방문할 수 있는 공공 문화 공간으로 변화했다.
사람이 살던 공간에 역사와 문화가 깃들며 또 다른 의미를 더해갔다.
이사장은 오초량이 지닌 혼합성과 부산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결국 그 자체가 한 도시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내년에는 동아시아 문화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풀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 달맞이길에 자리한 조현화랑 역시 부산의 예술적 흐름을 길게 이어준 또 다른 공간이다.
주민영 대표는 과거 광안리부터 시작해 현재 달맞이길까지 이어진 조현화랑의 여정을 계속 고민하며 새로운 시대와 지역적 변화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